미래를 향해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설사 디스토피아 일지라도 말이다. 『화성 연대기』를 읽어가는 것은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고 과학이 골렘으로 변한 날들과 대면하게 되는 과정이다. 미래가 암암한 과거의 기억처럼 오다 어느 순간에 아긋한 조각들이 맞춰지고 진심으로 나는 화성인이 되는 것이다.
“They knew how to live with nature and get along with nature. They didn’t try too hard to be all men and no animal. That’s the mistake we made when Darwin showed up. We embraced him and Huxley and Freud, all smiles. And then we discovered that Darwin and our religions didn’t mix. Or at least we didn’t think they did. We were fools. We tried to budge Darwin and Huxley and Freud. They wouldn’t move very well. So like idiots, we tried knocking down religion. We succeeded pretty well. We lose our faith and went around wondering what life was for. If art was no more than a frustrated outflinging of desire, if religion was no more than self-delusion, what good was life? Faith had always given us answers to all things. But it all went down the drain with Freud and Darwin. We were and still are a lost people.”
“그들은 자연과 함께, 자연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 점이야말로 다윈이 나타난 뒤로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로 다윈과 헉슬리와 프로이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윈과 우리가 가진 종교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아니, 적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바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윈과 헉슬리와 프로이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바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잃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이 단순히 좌절된 욕망의 장식에 지나지 않고, 종교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모든 일에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프로이트와 다윈과 함께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인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성 연대기 The Martian Chronicles』는 아이작 아시모프처럼 과학에 기초한 sf보다는 환상문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복고풍 분위기나 앞의 인용처럼 종교적 에피파니(epiphany)도 물씬 풍기는 작품이지만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에도 그의 소설이 낡삭아 보이지 않는 것은 외려 과학 지식에 기초한 sf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어쩌다 인종/여성차별에 대한 뉘앙스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로버트 하인라인이나 에드가 라이스 버로스의 마초이즘에 비할 바는 아니다. 리사 터틀이나 조안나 러스, 어슐러 르 귄이 활동하기 전에 대체 그렇지 않은 작품이 없으니 르 귄이 “SUR –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보인 관용으로(꼭 그것이어야 한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까뮈가 그르니에의 『섬』을 두고 “오늘 처음으로 이 책을 열어보게 되는 저 낯모르는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고 말했던가. 더도 덜도 말고 『섬』에 두른 이 휘장을 화성연대기에 덧댄다고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 이 『화성 연대기』로 인해 sf에 대한 내 편견은 산산조각이 났고 후에 번역된 거의 모든 sf를 보게 됐다. 그것은 다른 빛나는 SF 작가들과 조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내게 단 한 명의 sf 작가를 꼽으라면 어슐러 k. 르 귄을 꼽을 것이지만 단 한편의 sf를 꼽으라면 『화성 연대기』를 꼽을 것이다.
덧 – 『화성 연대기』는 모음사 동서추리문고 두 군데에서 나왔지만 오래전에 절판인 상태고 헌책방에서도 꽤 안 보이는 책이다. 모음사에서 87년과 90년 두 번에 걸쳐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것은 90년 모음사 판이다. 이 판형은 책 표지를 바꾸면서 ‘개정’이니 ‘재판’이니 하는 표시가 없다. 뿐만 아니라 책 표지에 ‘대이 브래드버리’라는 우습지도 않은 실수를 했다, 정작 큰 실수는 마지막 한 페이지가 누락된 것이다. “마이클이 말했다” 마이클이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으면 87년 판이나 동서추리문고 판을 찾아봐야 한다. 누구든 이 책을 읽는다면 마이클의 다음 말 때문만이 아니라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당장에 도서관으로 달려갈 것이다. 헌데 도서관에도 90년 판밖에 없다면 굉장히 슬프겠지.
브레드버리의 단편은 『플레이보이 sf걸작선』같은 모음집에 간간이 실려 있고, 외에도 『화씨451』과 『멜랑콜리의 묘약』『살아있는 공룡』이 번역됐으나 단행본들은 아쉽게도 죄다 절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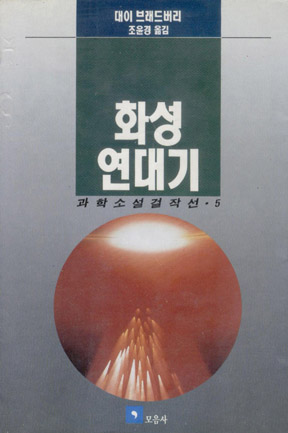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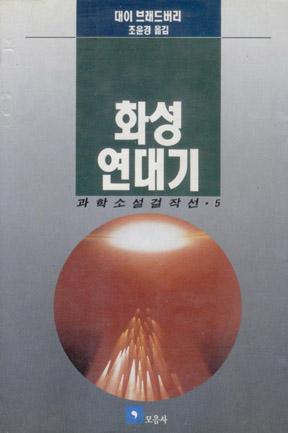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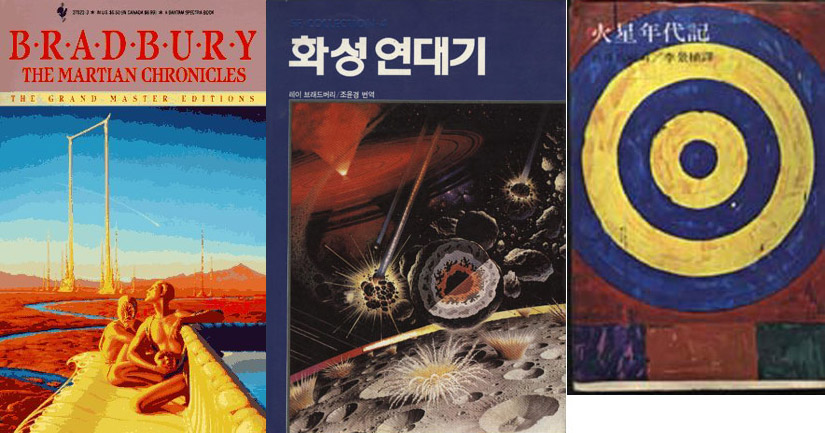
옛날에 읽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시 보고싶네요
네 다시 봐도 재미난 책이죠~ 🙂
쓰고 나서 우리동네 도서관 검색하니 과연 “대이, 브래드버리 저”라고 모음사판이 당당하게 보존자료실에 있네요 크흐흐 아참 근데 부깽님은 슬프겠다고 했는데 혼자 웃어서 미얀요=ㅂ=;
슬프긴요, 저도 슬프지 슬프지 하며, 말하자면 약 올리는 게죠. 쿨럭 ;; 90년판 정체는 이미 뽀록났으니 이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죠. 😉
캬학 재밌겠다 나중에 꼭 보고 싶어요>ㅅ
부깽이 이런 포스팅을 할때마다 약올리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_
내가 의도한 절판이 아니라서 말이지. 도서관 있잖아,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