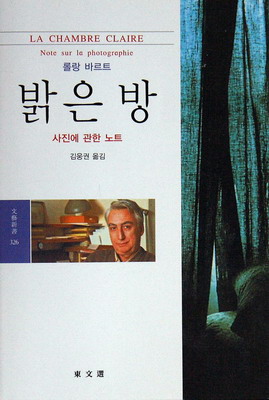흔들렸지만, 분명히 미묘다!
조계사에서
된더위에 늘어진 날, 조계사 어느 구석에서 작은대안무역 부스를 지키고 있었다.
뭔가 쓩하고 지나가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보니 임신한 냥이다.
다음 날도 그 자리를 쓩하고 지나간다. 쓩이라고 불러야지. 아, 쓩의 아이들은 어떨까?
무수한 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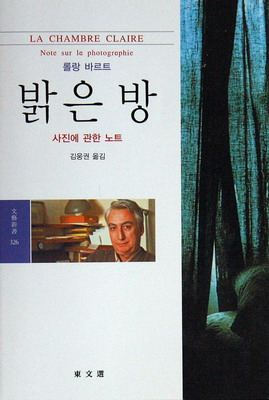
김승희는 『왼손을 위한 협주곡』 자서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의 不在가 아니라 무수한 遍在’라고 말한다. 사진에 대해 얘기하면서 죽음을 꺼내는 게 뜬금없어도 이 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진’이다. 죽음 혹은 사라진 것들, 기억에서 망각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고통과 찌름으로 연속된 사물들이다.
우리의 마음을 떠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사물이다. 사물은 차츰 기억을 떠올리고 그 안에 투영된 마음까지도 형상화하곤 한다. 그것은 롤랑 바르트가 프루스트를 빌어 말하는 ‘반과거’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매혹의 시제들. 사진은 숙주가 되어 사랑의 정경을, 처음의 황홀했던 순간을 뒤늦게 만들어낸다. 그러나 진실은 <토스카>의 아리아(E Lucevan Le Stelle)처럼 잿빛이다. “별은 빛나고 있건만” ‘그러나 그 행복은 결코 그대로는 돌아오지 않는다'(『사랑의 단상』).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행복, ‘실존적으로 결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을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사진의 특징이다. 롤랑 바르트는 『밝은방』에서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풀어낸다. 『밝은방』은 샤르트르의 『상상적인 것』에 경의를 표하는 오마주로 시작한다. 그것의 부제는 ‘상상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이고 롤랑 바르트는 현상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진을 찍은 이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사진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에포케가 그의 눈을 통해 얼렁뚱땅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깐 나폴레옹의 막냇동생 제롬의 사진을 보고서, “나는 황제를 보았던 두 눈을 보고 있다”는 놀라움을 마음껏 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사진의 미덕이다. 그냥 관람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굳이 바르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스투디움(studium)-나는 좋아한다’으로, 사진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즐거움을 가지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푼크툼(punctum)-나는 사랑한다’에 현혹된다면 사진은 이제부터 부재하던 것이 편재되는 매개이다. 그 기억들. 내 정신을 헤집던 것들. 다시 움트는 상처로, 온통 푸른 멍으로 몸은 또다시 옹송크려질 것이다. 슬픈 영화를 볼 게 아니라 옛 앨범을 뒤적이면 된다는 말이다.
바르트의 시대는 갔고, 누구나 하나쯤 들고 다니는 카메라, 거기에 관련된 책이라면 실은 『밝은방』 같은 게 아니라, ‘포토샵 보정’에 같은 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얼마 전 친구가 그러더라. “뽀샵이야말로 백익무해다.”라고. 사진첩을 정리하며 ‘어, 어, 이거 뭐지’하며 보고 또 봐도 기억이 안 난다면 역시 『밝은방』따위는 던져버리고 포토샵 관련 책을 보는 게 현명하다.
가베나루에서
가베와 나루의 아이일까,
의자 아래에서 뭘 보고 있니?
삼색고양이 캬라코
일러준 대로 교보에 들러 삼색고양이 캬라코를 봤다.
그리고 바로 만난 냥이, 너는 캬라코의 언니이니? 검은색, 흰색, 갈색 모두 잘 보이네.
캬라코처럼 팔을 높이 들어 인사를 건네는데, 톡톡 발톱을 세워 친다.
아, 내게는 갈색 점이 없지. 미안 🙂
섬진교
태풍 하루
틈만 있으면 어디든 숨을 곳


다른 책장에 숨었다가 풍아~ 부르면 고개를 배꼼

책도 보고 겸사 들어갈 곳도 찾고


그러다가 한참을 찾아 헤매게 한 책장 아래

만 하루를 지내고부터 방을 이리저리 뛰놀며

휴지통과 씨름도 하고

쥐돌이 냄새를 쫓고

캣타워에 서서 심심해하더니

캣타워를 오르며 나를 좀 봐달라고

이제는 자던 메이마저 깨우고

메이의 하악질에 그게 뭐 혼날 일이냐는 표정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덤벼보지만 땅을 치며 항복 항복

속았지 하며 한 방 날리고

비겁하다고 삐친 메이를 몰라라 다 큰 게 삐치느냐며 총총

놀만큼 놀았으니 슬슬 배가 고프고 그릇이야 엎어지든 말든

밥을 먹고 나니 슬슬 배가, 응가에도 자세가 있다던데

아롬은 태풍의 자세에 저 저 저 놀라워하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전엔 얼굴을 씻고

발도 닦고

누우면 어디서든 잔다며 엎어져 자다가

턱이 아프다며 침대로 옮겨 팔베개를 하고

잠깐 깨 오늘 냥이로써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며

동거인을 위해 이쁜 표정 몇 번 지어주시고



또 화장실에 가나 했더니 그 앞에서 쿨

실종된 태풍 키보드 뒤에서 발견

보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시 잠을 청하고

언제부턴가 나 찾아보라며 키보드 뒤를 아지트로 삼고

어떻게 찾았느냐며 놀라워도 하고

어디서든 우아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여유로움으로

새벽에 깨어 심심하니 놀아달라고 떼도 써보고

오뎅꼬치에 말리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삐끗

또 삐끗

에잇 참을 수 없다며 만세로 덤비고

점프도 불사하고

한번 문 꼬치는 자기 거라며 필사적으로

결국 품위 따위는 내버리고

똥꼬가 보이든 말든

그러나 1편은 여기까지만 다시 우아하게, 안녕 풍~

나도 화낼 줄 알아
향일암
먼데서 바람 불어도 풍경소리 들리지 않는다.
고래는 바다로 가고 풍경소리 쫓던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은 갈 데가 없네.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노란 눈 보일라